오현명 "우리 가곡 우리가 안 부르면 누가 부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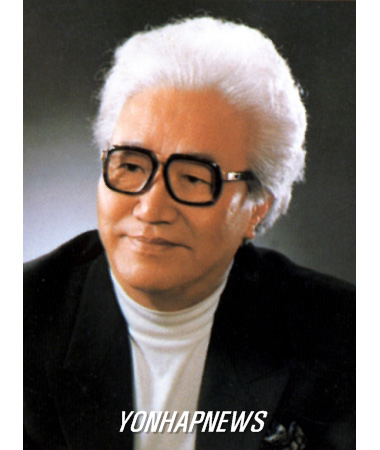
가슴을 울리는 저음과 넉넉해 보이는 웃음, '트레이드 마크'가 된 눈부신 백발의 성악가 오현명(81) 씨.
한국 가곡 전도사로 일평생 살아온 그가 다음달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한국가곡 대축제'(연합뉴스 22일자 기사 참조)의 고문을 맡아 다시 한번 우리 가곡 알리기에 나선다.
한국가곡 대축제는 1920년 홍난파의 '봉선화'에서 2005년 신작 가곡까지 우리 가곡 80여 년 역사를 대표하는 200곡을 골라 두 달여 간 주 1회씩 모두 10회에 걸쳐 연주하는 행사다.
오씨 외에도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얼굴'의 작곡가 신귀복, 테너 안형일, 소프라노 채리숙, 테너 김진원 등 대표급 원로들과 중견ㆍ신예들이 총출동하는 사상 유례없는 공연이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대중음악에 밀려 침체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행사가 생겨서 우리 가곡 살리기에 나선다니 다행이에요."
보통 성악가들이 귀국 독창회를 비롯한 개인 발표회 때마다 오페라 아리아, 외국 가곡 일색으로 레퍼토리를 꾸미는 것과 달리 오씨는 1963년부터 한국 가곡으로만 독창회를 열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필생의 작업'으로 한국가곡 부르기를 약속했다는 그는 이후 20여 년에 걸쳐 10여 차례의 한국가곡 독창회를 열었다.
"외국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성악가 스스로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개중엔 앵무새처럼 뜻도 모른 채 외국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그러니 듣는 관객은 더하지요. 노래의 내용이야 어떻든 그저 멜로디와 성악가의 소리만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예술가곡은 절대음악과 달리 그 안에 시(詩)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음미할 수 없다면 그 노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씨는 말한다.
그는 "나도 한 때 독일 리트(예술가곡)에 심취해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며 공부하곤 했지만 그 시의 오묘한 정신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며 "뜻을 모르면서 외국어 암기하듯 외워 부르는 노래가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가곡사랑은 1981년 독일 쾰른대 음대 교환교수로 가 있으면서 더욱 확고해졌다고 한다.
"유럽에 나가 보니 독일에선 독일 가곡만 부르고, 이탈리아에선 이탈리아 가곡이나 아리아만 부르고, 각자 자기네 나라 노래만 부르더군요. 바로 이거다 싶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노래를 안 부르면 누가 대신 부르겠습니까?"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양 서탑교회에서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부른 게 처음 대중 앞에 선 기억이라고 했다.
'보리밭'을 작곡한 윤용하, 몇 해 전 작고한 지휘자 임원식 등이 그곳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일제 말기 일본군에 징병 1기로 끌려갔다가 일본서 해방을 맞고, 이듬해인 1946년 2월 서울대 음대의 전신인 경성 음악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해방되던 해가 내 음악생활의 원년이나 마찬가지"라며 "광복 60주년과 함께 내 음악인생도 60년이 되는 만큼 감회도 더욱 크다"고 말했다.
여든을 남긴 나이이지만 얼마전 솔리스트 앙상블과 미국 공연도 다녀오는 등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이번 한국가곡 대축제에서도 노래(10월 27일)와 해설(9월 8일)을 할 예정이다.
인생의 남은 기간,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도 너무 많다"고 답한 오씨는 "그중에서도 우리 가곡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만 세월이 무척 빨리 간다"며 아쉬워했다.
공연문의 ☎02-3487-2021
(연합뉴스)
한국 가곡 전도사로 일평생 살아온 그가 다음달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한국가곡 대축제'(연합뉴스 22일자 기사 참조)의 고문을 맡아 다시 한번 우리 가곡 알리기에 나선다.
한국가곡 대축제는 1920년 홍난파의 '봉선화'에서 2005년 신작 가곡까지 우리 가곡 80여 년 역사를 대표하는 200곡을 골라 두 달여 간 주 1회씩 모두 10회에 걸쳐 연주하는 행사다.
오씨 외에도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얼굴'의 작곡가 신귀복, 테너 안형일, 소프라노 채리숙, 테너 김진원 등 대표급 원로들과 중견ㆍ신예들이 총출동하는 사상 유례없는 공연이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대중음악에 밀려 침체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행사가 생겨서 우리 가곡 살리기에 나선다니 다행이에요."
보통 성악가들이 귀국 독창회를 비롯한 개인 발표회 때마다 오페라 아리아, 외국 가곡 일색으로 레퍼토리를 꾸미는 것과 달리 오씨는 1963년부터 한국 가곡으로만 독창회를 열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필생의 작업'으로 한국가곡 부르기를 약속했다는 그는 이후 20여 년에 걸쳐 10여 차례의 한국가곡 독창회를 열었다.
"외국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성악가 스스로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개중엔 앵무새처럼 뜻도 모른 채 외국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그러니 듣는 관객은 더하지요. 노래의 내용이야 어떻든 그저 멜로디와 성악가의 소리만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예술가곡은 절대음악과 달리 그 안에 시(詩)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음미할 수 없다면 그 노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씨는 말한다.
그는 "나도 한 때 독일 리트(예술가곡)에 심취해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며 공부하곤 했지만 그 시의 오묘한 정신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며 "뜻을 모르면서 외국어 암기하듯 외워 부르는 노래가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가곡사랑은 1981년 독일 쾰른대 음대 교환교수로 가 있으면서 더욱 확고해졌다고 한다.
"유럽에 나가 보니 독일에선 독일 가곡만 부르고, 이탈리아에선 이탈리아 가곡이나 아리아만 부르고, 각자 자기네 나라 노래만 부르더군요. 바로 이거다 싶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노래를 안 부르면 누가 대신 부르겠습니까?"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양 서탑교회에서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부른 게 처음 대중 앞에 선 기억이라고 했다.
'보리밭'을 작곡한 윤용하, 몇 해 전 작고한 지휘자 임원식 등이 그곳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일제 말기 일본군에 징병 1기로 끌려갔다가 일본서 해방을 맞고, 이듬해인 1946년 2월 서울대 음대의 전신인 경성 음악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해방되던 해가 내 음악생활의 원년이나 마찬가지"라며 "광복 60주년과 함께 내 음악인생도 60년이 되는 만큼 감회도 더욱 크다"고 말했다.
여든을 남긴 나이이지만 얼마전 솔리스트 앙상블과 미국 공연도 다녀오는 등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이번 한국가곡 대축제에서도 노래(10월 27일)와 해설(9월 8일)을 할 예정이다.
인생의 남은 기간,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도 너무 많다"고 답한 오씨는 "그중에서도 우리 가곡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만 세월이 무척 빨리 간다"며 아쉬워했다.
공연문의 ☎02-3487-2021
(연합뉴스)

